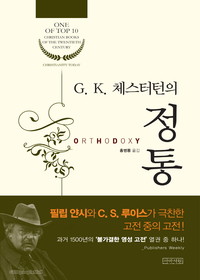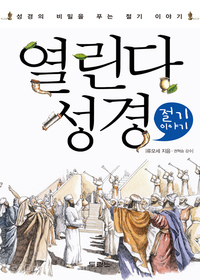Shop
G. K. 체스터턴의 정통 (Orthodoxy)
$40.00 $28.00

「퍼블리셔 위클리」 선정, ‘과거 1500년의 불가결한 영성 고전’ 10권 중 하나
20세기 초 영국의 탁월한 저널리스트이자 『브라운 신부』의 작가이기도 한 체스터턴의 신앙고백.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정통신앙에서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 풀어낸 책으로, C. S. 루이스와 필립 얀시의 극찬을 받았다.
▒ 출판사 리뷰
유물론, 진화론, 과학주의, 회의론, 니체주의, 자유사상 등에 대한
치밀하고도 명쾌한 비판!
– 필립 얀시, C. S. 루이스, 찰스 콜슨, 강영안 교수 추천!
기독교 신앙에 이르는 무수히 많은 길 중에서 체스터턴이 거쳐 온 길은 매우 독특하다. “열두 살 때는 이방인이었고, 열여섯 살에 이르러는 완전한 불가지론자가 되었다”는 고백처럼,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런 그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가 자주 들었음 직한 ‘신비한 체험’이나 ‘뜨거운 감동’ 때문이 아니었다. 세상 사조들, 넓게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집요한 물음과 정답을 향한 치밀하고도 분석적인 사고 덕분이었다.
그는 현대를 지배하는 똑똑한 사조들에서 모순과 거짓을 발견한 반면, 매력 없고 심지어 허구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허술한 기독교에서 ‘역설적 진리’를 발견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다른 모든 철학들은 진리로 뻔히 보이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유독 이 철학만은 진리로 보이지 않지만 실은 진리인 것을 거듭해서 말해 주었다. 모든 신조 가운데 오직 이 신조만이 매력적이지는 않아도 설득력이 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신앙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
무엇보다 현대 사조들의 공격에 반격하며 기독교의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역설의 거장’다운 명쾌한 비판, 화가의 섬세한 시각적 기법, 작가의 숨결이 녹아 있는 문학적 표현은 감탄을 자아낸다. 이 환상적인 여정을 함께 걷다 보면, 누구라도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에 설득될 것이다!

누군가 체스터턴에게 만일 무인도에 표류하면 무슨 책을 갖고 가고 싶은지를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한 뒤에 “물론 배 만들기에 관한 실용적인 안내서지”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표류하게 되어 성경 이외에 한 권을 택할 수 있다면 나는 체스터턴의 영적 자서전인 『정통』을 선택할 것이다. (서문_필립 얀시, 15쪽)
나는 내 나름의 이단을 창설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거기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정통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41쪽)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의심을 품되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뒤집혔다. 요즈음 사람이 내세우는 부분은 사실 내세우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바로 그 자신이다. 그가 의심하는 부분은 마땅히 의심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바로 신적 이성(Divine Reason)이다. (81-82쪽)
나는 인생을 무엇보다 하나의 이야기라고 언제나 생각해 왔었다. 만일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당연히 이야기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43쪽)
기독교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볼 뿐 아니라 바깥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경이감과 열정을 품은 채 신적인 동반자와 신적인 우두머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격렬하게 주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음과 같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사람은 내면의 빛과 함께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해처럼 아름답고 달처럼 청명하며 군기 달린 군대처럼 무서운 저 바깥의 빛을 명백히 인식하는 즐거움이다. (175-176쪽)
이방사상은 대칭으로 균형을 잡아서 똑바로 선 대리석 기둥과 같았다. 기독교는 주춧대를 건드리면 흔들거리면서도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서로 균형을 잡아 주기 때문에 천년 동안 보좌에 놓여 있었던, 울퉁불퉁하고 거대한 낭만적인 바위와 같았다. (222쪽)
만일 그 기둥이 하얀색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페인트칠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당신은 언제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이다. (254쪽)
우울은 간주곡과 같이 막간에 생기는 일시적인 마음 상태여야 한다. 반면에 찬양은 영구적인 영혼의 맥박이 되어야 한다. 비관주의는 기껏해야 감정적인 반쪽짜리 휴일일 뿐이다. 기쁨은 모든 것을 살아 숨 쉬게 하는 소란한 노동과 같다. (342쪽)

서문_필립 얀시
머리말
chapter 1 서론│다른 모든 것을 변호하며
chapter 2 미치광이
chapter 3 생각의 자살
chapter 4 요정 나라의 윤리
chapter 5 세계의 깃발
chapter 6 기독교의 역설
chapter 7 영원한 혁명
chapter 8 정통신앙의 로맨스
chapter 9 권위와 모험가
옮긴이의 말

_필립 얀시
강한 무신론자로 남고 싶은 젊은이는 그의 글을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_C. S. 루이스
체스터턴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계 안에 있는 정통신앙의 빛을 보라고 손짓하고 있다.
_찰스 콜슨, 인터내셔널 프리즌 펠로십 창설자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시속 200킬로 이상의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을 받았다. 도중에 일어나 한 바퀴 걷고 숨을 고른 다음 다시 앉아서 읽고 감탄하고, 다시 일어나 쉬다가 또다시 책을 손에 들고 읽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_강영안, 서강대 교수

| Weight | 1 lb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