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The God-Shaped Brain)
1 × $19.60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 (The God-Shaped Brain)
1 × $19.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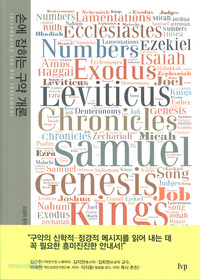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Introducing the Old Testament: A Short Guide to Its History and Message)
1 × $18.20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Introducing the Old Testament: A Short Guide to Its History and Message)
1 × $18.20 -
 사람이 선물이다 (2011 올해의 신앙도서)
1 × $16.80
사람이 선물이다 (2011 올해의 신앙도서)
1 × $16.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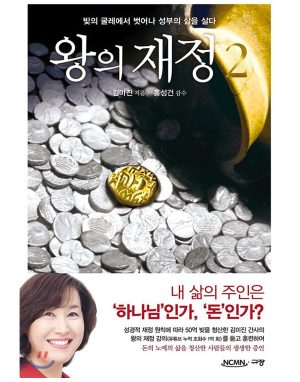 왕의 재정 2
1 × $21.00
왕의 재정 2
1 × $21.00 -
 꼭 안아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1 × $19.60
꼭 안아주세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1 × $19.60 -
 2025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
1 × $79.00
2025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
1 × $79.00 -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당신을 위한 묵상집
1 × $21.00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당신을 위한 묵상집
1 × $21.00 -
 [개역개정판] 하나님의 약속 900선 (비닐/민트)
1 × $8.50
[개역개정판] 하나님의 약속 900선 (비닐/민트)
1 × $8.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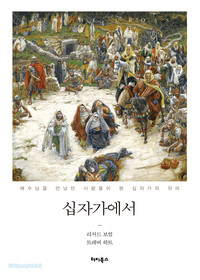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본 십자가의 의미 (At the Cross)
1 × $19.60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본 십자가의 의미 (At the Cross)
1 × $19.60 -
 시편의 흐름 (The Flow Of The Psalms)
1 × $35.00
시편의 흐름 (The Flow Of The Psalms)
1 × $35.00 -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1 × $28.00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1 × $28.00

Shop

– ‘설교자의 말’ 전문
[출판사 서평]
‘지금, 여기’ 이 시절을 살아가는 설교자의 말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 시기. 크리스천으로서 이 시기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 내야 할까.
저자가 이 시기 앞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우선 부끄러움이다.
그는 “종일 뉴스를 접하며 코로나의 일과에 나의 일상을 결정하는 한 날”과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교회를 상대하는 모습”과 “교회가 세상을 해석하는 일”, “코로나의 일정에 따라 교회를 통제하려는 세상의 관원들과 함께 숨을 쉬어야 하는 교회”가 부끄럽다고 말한다. 그가 이렇게 부끄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가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주 예수의 때라는 것을 발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름다운 발로 코로나와 같은 열방의 경계를 넘는 자들의 서사가 빠지고 있”으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좇는 복음 전도자들의 여정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누군가로부터 “개신교가 속속 주일 예배를 쉬겠다고 하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았던 모양이다. 저자는 그 질문에 대해 “질문이 안 되는 물음을 받을 때 하염없이 부끄럽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저자는, “세상이 예배를 향해 외친다. ‘좀 쉬라’고, ‘코로나가 잠잠할 때까지 미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채색옷을 입은 자의 향기인, 예배를 알지 못한다. 검으나 아름다운 은혜를 입은 자의 찬송인, 예배를 알지 못한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자의 기도인, 예배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예배는 “학교 개강을 연기하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저자가 보기에는 지금이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때”다. “감당할 수 없는 운명에 합류된 때”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세상의 목소리들로 소란스러운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시기를 바라보고, 살아 내며,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 저자는 자신의 대답을 들려준다. 지금이 바로 “사람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주만 아시는 사랑으로 바꾸시는 때”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때”라고.
그리하여 “‘사랑, 그 요청하지 않은 우연’을 향하는 때”라고.

머리글
하나뿐인 사랑
사랑의 첫 장, 입맞춤
검으나 아름다운 세계
양 떼의 발자취
은유, 그 묘사의 신비
푸른 침상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잡목 중의 사과나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포도원을 허는 여우
모르는 사랑
면류관
흠이 없는 사랑
쉼표가 없는 사랑 _
골고다의 거리
전체가 사랑스럽다
우리, 한 무리 양 떼의 신비
제일의 여인, 으뜸인 사랑
교회, 그 아름다움의 신비
바쳐진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 Weight | 1 lbs |
|---|



